/
2022년 주목할 이슈를 미리 파악하는 발 빠른 마케터가 되어보세요.
바로가기새로운 도구, 전문가의 견해, 활용 가능한 분석 정보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운영 및 관련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바로가기다양한 마케팅 상품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비교하여 집행해보세요.
바로가기혼자서는 어려웠던 마케팅 노하우를 얻어가세요
바로가기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해 혜택 꼭 챙겨가세요.
바로가기e커머스 사업에 꼭 필요한 핵심 TOOL을 모아두었습니다.
바로가기
네이버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와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를 위한 키워드의 월간 검색수, 클릭수, 클릭률, 경쟁정도, 노출광고 수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성장시켜보세요. 가장 중요한 네이버 검색 노출에 최적화 시켜보세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사이트 방문자, 페이지, 유입경로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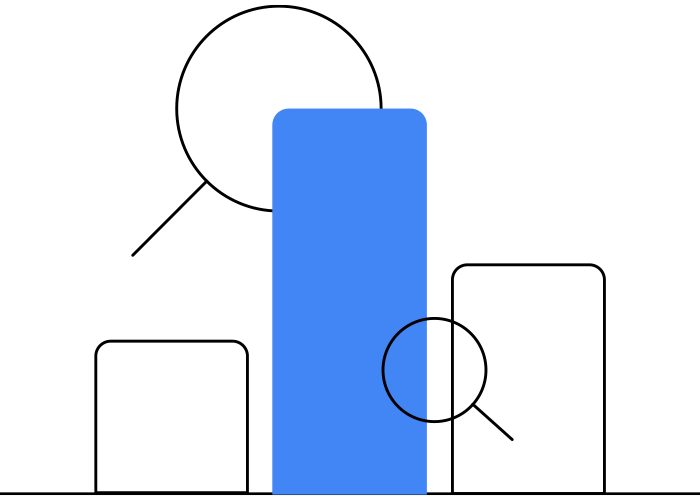
소비자의 검색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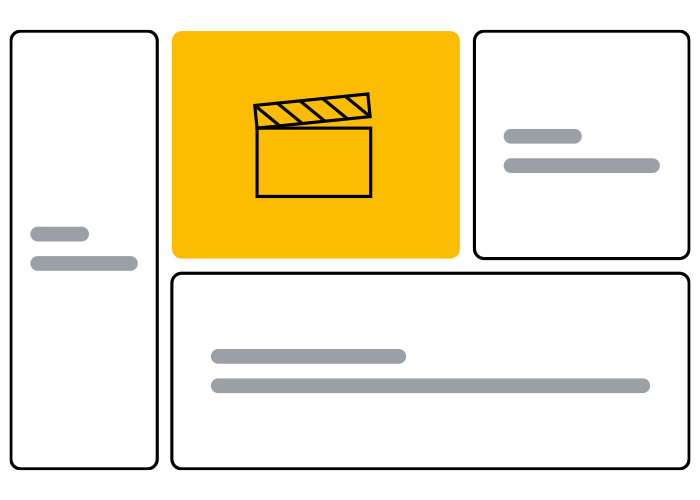
혁신을 주도하는 광고주와 에이전시가 제작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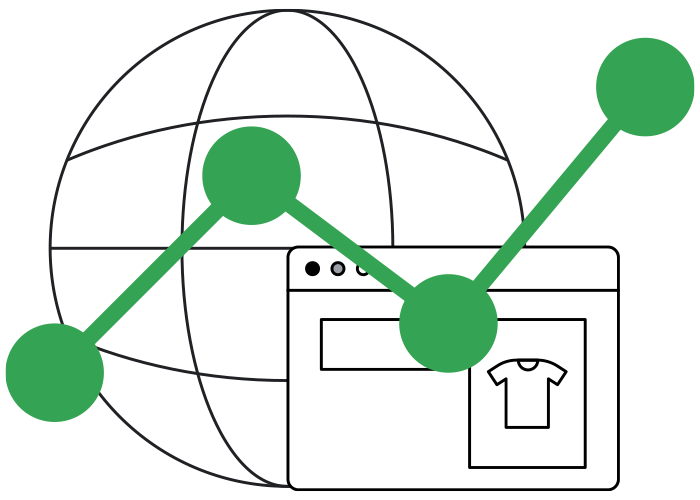
중소 규모 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고 마케팅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고객 통계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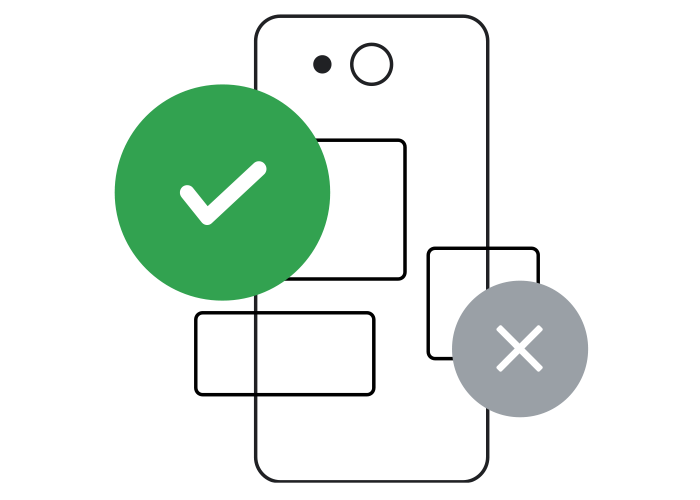
모바일 사이트 속도를 동종 업계 사이트와 비교해보고,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