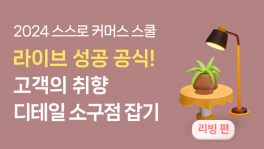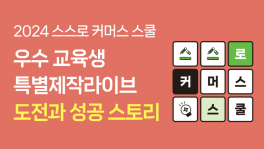인간이 조직에 속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기 시작한 이후, 뜨는 직업, 유망한 직업, 인기 있는 직업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핫한 주제가 아닐까.
부모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보수 좋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들이 전통적으로 인기였지만 이젠 다들 안다, 그런 직업들도 결코 “안정과 높은 보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건 불황이건, 취업환경에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특히 문과 대학생들의 선호도 1위 직업은 “마케터”가 아닐까.
30년 가까이 마케팅 업으로 갑근세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기엔, 90년대-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케터”라는 “직종” 보다는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처럼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은가를 위주로 대학생들이 고민해 왔던 것 같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공채가 대규모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직무 지원보다는 가고 싶은 회사를 지원해서 배치받은 후 업무는 거의 랜덤으로 배정되기도 했고 와중에 “마케팅부”는 뭔가 영업도 아닌 홍보도 아닌, 광고대행사를 부리는 부서 정도의 이미지였다. (반박 시 님 말씀이 맞지만 제 기억은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터”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국내 기업에서는 “마케팅 부서”, 그나마 외국계 소비재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함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2010년 전후로 “마케터”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니 (내 생각엔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케팅이 필요한 산업과 조직의 저변이 넓어졌고 새로운 세대들이 마케팅 업무뿐 아니라 마케팅에서 파생된 업무까지 맡으면서 ‘브랜드만 매니지’하는 사람이 아닌, 마케터로 본인들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관련한 책, 커뮤니티도 많이 생기고 대학생들도 전공 상관없이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체감된다. (체감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팩트는 아님)
그런데,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하고, 마케팅에 흥미를 갖는 것일까?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글로벌 브랜드 –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 BMW, 도브, 로레알, 삼성 등- 의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하고 특화된 포지셔닝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리고 대중들이 인지하는 마케팅 업무의 아웃풋은 “광고”라고 불리는 캠페인과 신제품, 소비자 프로모션 아이디어들이었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광고 인지도, 호감도, 시장 점유율, 판매 증감률 등이 있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부터 (아니면 더 일찍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브랜드’ 마케팅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면서 소비재 (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마케팅 포지션도 더 이상 핫한 포지션이 아니게 되었다. 유럽계 소비재 회사의 한국 마케팅 디렉터였던 2015년, 본사에서 열린 마케팅 디렉터 써밋에서 CEO가 한 말인 “FMCG is not hot any more”는 마케팅에선 이미 본격화되고 있었던 것.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광고 봤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광고에 나온 제품 주세요” 라며 소비를 하지 않고,
TV 앞에 모여 앉아 최애 드라마를 기다리며 광고를 같이 보지 않고,
매장에서 품절된 제품이 재입고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신,
“요즘 유튜브에 그 브랜드 많이 나오더라” “나 인스타에서 팔이피플이 그 브랜드 공구하는 거 보고 혹해서 샀어” “올영 매장에서 블러셔 발색 테스트해 보고 바로 쿠팡 로켓 배송으로 삼” “토스에서 만보 인증하면 포인트 준데” “마켓컬리 친구 추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준데”
와 같은 대화들이 우리 일상을 빼곡하게 채우게 된 것이다.
이런 일상에서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멋진 (=제작비가 비싼) 영상으로 제작한 광고를 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소비자들.
이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즘 “마케팅”은 그로스 마케팅 (growth marketing), 퍼포먼스 마케팅 (performance marketing) 그리고 제품에 집중한 프로덕 마케팅 (product marketing)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각설하고 “나에게 주는 즉각적 이익이나 분명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소비자들의 주요 니즈가 되었으니 당연한 트렌드이다.
ROAS (Return On Advertising Spending)을 주요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런 마케팅이 브랜드와 제품의 성공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이고 데이터이다. “크리에이티브하고 멋진, 광고제 씹어 먹을 것 같은 광고 소재”가 아닌, 내가 도달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클릭이나 앱 다운로드로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광고 소재를 AB 테스트를 통해 가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소재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 “즉각 반응”에 동일 소재의 1-2달 집행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광고 소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AI의 발달은 퍼포먼스 마케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소비재이든, 테크 플랫폼이든, 자동차 같은 고관여 제품이든, 서비스이든 막론하고 요즘은 대부분 그 “제품의 베네핏” 자체에 집중한다. 고객들이 소비하는 매체가 너무나도 다양화되고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15초, 30초 광고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 광고를 돌릴 수 없다. PPL 도 유튭, 셀렙 협찬, 웹툰 협찬 등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고, 숏폼용 메시지, PPL 용 메시지, 앱 배너 광고용 메시지 등 다양화되어야 하고 은하수같이 무궁무진한 콘텐츠들 틈에서 고객들의 시선을 붙잡으려면 “빠르게 이해되고” “누르지 않고선 못 배기는” 혜택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닭볶음면은 “매운맛 챌린지”, 테무는 “첫 구매 시 최대 98% 할인”, 롯데카드는 “최대 16만 원 상담 혜택”. 물론 이 브랜드들도 브랜드의 감성적 소구를 위한 광고도 진행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의 시대는 저물고, 퍼포먼스 마케팅과 제품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는 지금.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도 현재 마케팅에 대한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크리에이티브하니까’, ‘나는 기발하니까’ 보다는 ‘나는 확실한 데이터를 좋아하니까’ ‘나는 숫자 감각이 있으니까’ ‘나는 판단이 정확하니까’가 지금 마케터에겐 더 필요한 자질일지도.
그러니까 F 가 마케팅을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마케터에게 필요한 성향은 T 일 거라는. 또는 F와 T의 환상적인 조화? (어렵군. 어려우니까 ‘존잘’ 마케터가 되기 어려운 것 아닐까)

이렇게 창의력 뿜뿜도 좋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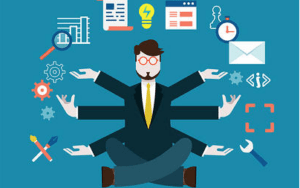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고 즉각적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마케터의 숙명이니..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마케팅] 블로그 트렌드 2025, 왜 젊은 세대는 다시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할까?](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feb361907937f91f5091efbf308b1671_1738802835_0789_80x80.webp)
![[마케팅] 2025 마케팅 캘린더: 월별 주요 이슈와 키워드 완벽 정리!](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1/thumb-1a8478142a4f204a9c76127bc70f04ec_1737337666_7264_80x80.webp)
![[마케팅] 인스타그램 도달률을 높이는 9가지 핵심 노하우 (릴스, 사진, 오디오 활용)](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fb3a5f656955f5d9c88a1fedeed3347a_1739234970_1175_80x80.webp)
![[마케터의 업무일지] 마케터의 업무 스케줄 관리 방법 feat.노션 템플릿](https://domaelist.com/data/file/marketing/thumb-51803d4b4be3227d03dd64a694b1e259_h081MLR7_9d599d15cb8833bd13b20f54bf88bd89e10e06d5_80x80.png)
![[마케팅] 블로그 키워드 분석, 트래픽을 2배로 늘리는 비법!](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3448_5658_80x80.webp)
![[마케팅] SEO만으로 충분할까? 진짜 중요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2665_5285_80x80.webp)
![[커머스] 네이버 vs 쿠팡, 무료 반품 전쟁! 판매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2205_1391_80x80.webp)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비즈니스 성과를 2.86배 높이는 전략](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2056_6535_80x80.webp)
![[마케팅] 블로그 키워드 분석, 트래픽을 2배로 늘리는 비법!](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3448_5658_264x149.webp)
![[마케팅] SEO만으로 충분할까? 진짜 중요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2665_5285_264x149.webp)
![[커머스] 네이버 vs 쿠팡, 무료 반품 전쟁! 판매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2205_1391_264x149.webp)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비즈니스 성과를 2.86배 높이는 전략](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d466cb1437cab8128cfbff36275d073b_1740622056_6535_264x149.webp)
![[NEWS] 주4일 근무제 논란, 자영업자 목소리도 고려해야!](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fb3a5f656955f5d9c88a1fedeed3347a_1739235690_7591_264x149.webp)
![[NEWS] 트럼프의 25% 관세 발표, 한국 경제 긴장감 고조!](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fb3a5f656955f5d9c88a1fedeed3347a_1739235527_3867_264x149.webp)
![[마케팅] 인스타그램 도달률을 높이는 9가지 핵심 노하우 (릴스, 사진, 오디오 활용)](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fb3a5f656955f5d9c88a1fedeed3347a_1739234970_1175_264x149.webp)
![[광고] 리타깃팅 광고, 과연 필수일까? 실전 분석으로 보는 최적의 활용법](https://domaelist.com/data/editor/2502/thumb-e91e877909a53283d847382d4ed2c43c_1738808993_7306_264x149.webp)